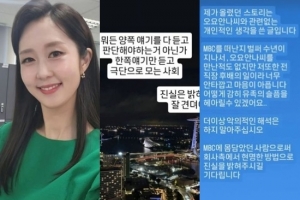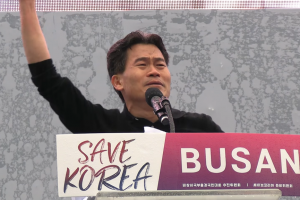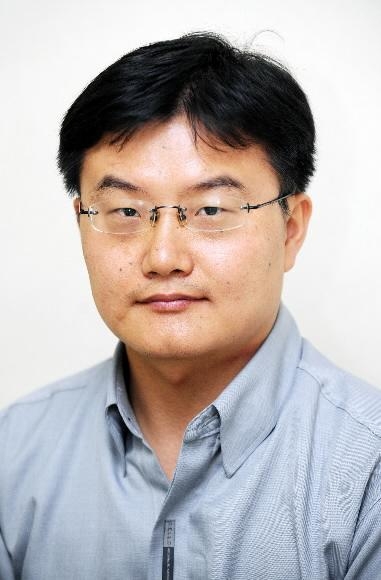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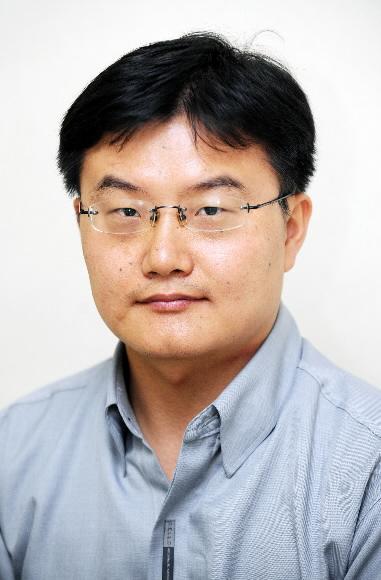
강국진 정책뉴스부 기자
군청에선 결국 그 계장을 좌천시키고 곧바로 청소년수련시설에 허가를 내줬다. 그리고 1년도 안 돼 그곳에서 화재가 났다. 유치원생 19명을 포함해 23명의 목숨을 화마가 앗아갔다. 온 국민은 이 시설이 콘크리트 1층 건물 위에 컨테이너 수십 개를 얹어 화재에 취약한 가건물 형태였다는 걸 알고 충격에 빠졌다. 화성군청 관계자들이 줄줄이 구속됐다. 그 계장은 동료들을 배신했다는 따가운 시선에 무척이나 힘들어했다고 한다. 결국 이듬해 명예퇴직했다.
‘씨랜드 화재사건’을 계기로 획기적인 제도정비가 이뤄졌다는 얘길 들어본 적이 없다. 우리는 주기적으로 서해훼리호, 대구지하철, 씨랜드, 세월호 악몽에 시달린다. 그때마다 ‘시스템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자기파괴적인 신념을 학습한다. 물론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 계장을 ‘참 공무원’이라며 칭송했던 우리가 언제 그랬느냐는 듯 ‘이장덕’이란 이름 석 자를 금세 잊어버렸던 것도 한 원인이 아닐까.
현장을 잘 아는 공무원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주는 개혁을 했다면, 국민안전을 위한 더 엄격하고 촘촘한 규제를 만들고 정비했다면, 공공성을 내팽개친 공직자를 고발할 수 있는 ‘호루라기’를 쥐어줬다면 어땠을까. 하다 못해 이장덕 계장을 이장덕 과장으로, 국장으로 승진시켰다면, 책임감 있는 공무원은 출세한다는 학습효과라도 줬다면, 세월호 참사로 뼈저리게 깨닫게 된 ‘시스템 붕괴’에 국민이 절망하는 사태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공무원을 조롱하고 비난하기는 쉬운 일이다. 대한민국 대표 공무원인 대통령이 앞장서서 공무원을 심판하겠다고 하는 세상이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우리는 더 많은 이장덕을 발굴하고 키워내지 못하는 것일까’ 하는 성찰이다. 우리 사회는 이장덕 같은 일선 공무원들이 더 많은 권한을 부여받고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고 격려해 줬는가. 현장 공무원은 실권이 없고 고위직들은 현장을 모르는 나라에서 ‘공무원’을 생각한다.
betulo@seoul.co.kr
2014-04-26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