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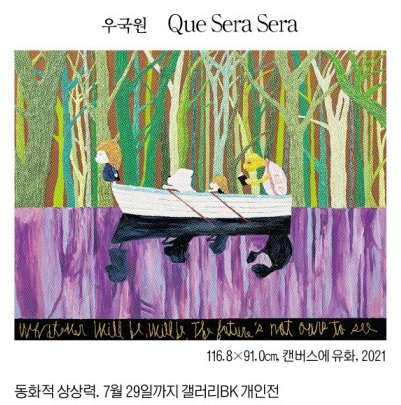
볕이 내린다 끝도 없이
아무도 모르게 햇볕도 늙는다
담뱃불처럼 반짝 타오르면서 나는
볕보다 오래 살 것처럼 핏대를 세우지 않았던가
낡은 외투를 버린다
내 젊었던 몸이 기거한 곳이다
그대 얼굴이 사진 속에서 웃는다
주름진 내 입가가 따라 웃는다
자정 넘어 귀가한 날
요람 속에서 방긋 웃던 아가를
어떻게 안아야 할 줄 몰랐던 나였지만
수학 문제를 풀며 눈물 흘리는 초등학생은
꼭 안아 줄 것이다
꿈에 속도가 있다니 생각해 보지 못한 개념이다. 꿈은 은하수처럼 하늘 먼 곳에서 반짝이는 존재가 아니었던가. 시를 읽으며 내가 지닌 꿈의 개념이 추상적이라는 생각을 한다. 꿈은 느리지만 천천히 찾아오는 것이다. 핏대를 세우던 젊은 날도, 낡은 외투를 불태우던 날도, 사진 속의 그리운 그대가 웃는 날도 기실은 꿈을 향해 느리게 나아가는 순간임을 깨달을 때 마음 안의 햇볕은 비로소 옛 빛을 찾는다. 추적자의 눈을 피해 도적처럼 들른 자정의 집. 요람 속의 방긋 웃는 아가를 어떻게 안아야 할 줄 모르는 아비의 모습. 그 아비를 꼭 안아 주며 눈물 흘리는 초등학생 아이의 모습 속에 우리가 견뎌 낸 지난 시절의 자화상이 스며 있다.
2021-06-25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