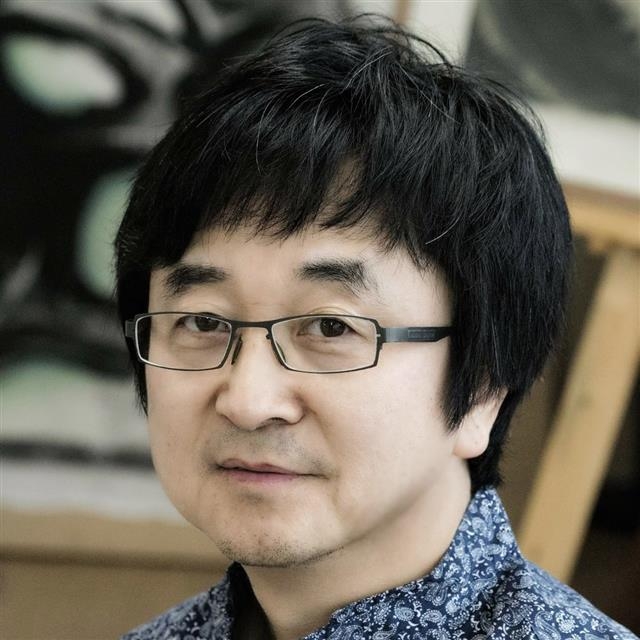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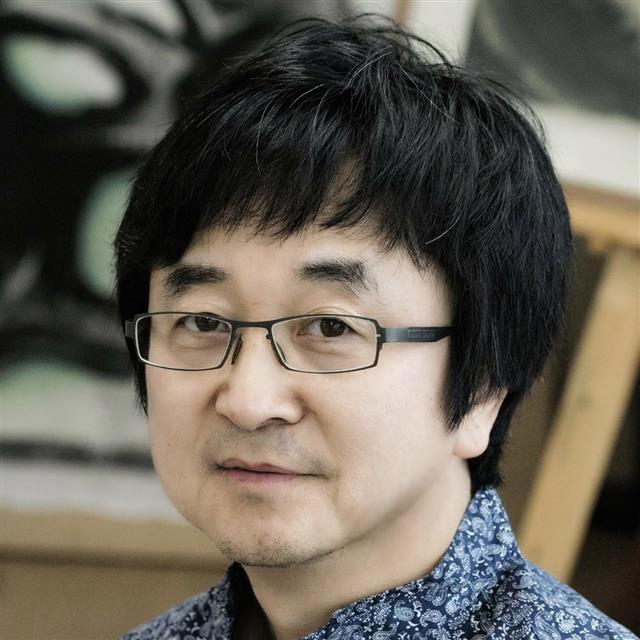
김주대 문인화가·시인
야생의 오리가 가게까지 찾아오는 게 신기하다.
가게 안에 있다가 오리를 본 할머니가 ‘저노무 새끼들 똥 때문에 죽겠다’고 신경질을 내신다.
오리들이 할머니를 보자 꽥꽥대며 궁둥이를 마구 씰룩거린다.
할머니가 “아이구, 저노무 새끼들” 하고 한번 더 소리를 지르더니 진열대 밑에 숨겨 둔 오리 밥(사료)을 꺼내어 공터에 쏟아 주신다.
오리들이 정신없이 밥을 먹는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참새들도 와서 같이 먹는다.
“할머니, 가게 앞에 똥도 싸고 그러는데 오리한테 왜 밥을 주세요?”
“자꾸 찾아오는 걸 어떡해. 우리 영감도 오리 찾아오는 거 아주 싫어해.”
“그럼 밥을 주지 마시지요?”
“자꾸 찾아오는 걸 어떡해.”
“그러니까 밥을 안 주시면 안 찾아오잖아요.”
“저래 찾아와서 조르잖아, 밥 달라고. 아주 성가셔 죽겠어. 사람은 안 오는데 저것들은 오잖아.”
“아, 그러니까 밥을 주지 마세요.”
나는 할머니의 반응이 재미있어서 일부러 자꾸 도발적인 질문과 대꾸를 한다.
그렇지만 생명을 대하는 할머니의 태도는 한결같다.
“오는 걸 어째 안 줘, 손님 같으면 밥 달라고 찾아오는 걸 안 줄 수가 있겠어?”
“저 같으면 오리 똥이 무서워서 안 줄 거 같아요.”
“똥보다 더 무서운 거시 인정이라 개미 새끼 하나 안 찾아오는 나한테 저렇게 나 하나 보고 찾아오는데 어째 안 줘?
우리 영감이 뭐라 캐도 줘야지.”
오리는 야생을 다소 잃고 인정(人情)에 기대는 것처럼 보였고, 할머니는 사람에게 정을 얻지 못한 대신으로 오리에게 인정을 쏟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인정은 종을 초월해서 이동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오리가 여기저기 아무렇게나 싸는 똥은 더럽지만, 야생 오리와 할머니 사이에 왕래하는 정은 뜨듯했다.
잘 먹지 않는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며 할머니께 기념사진을 찍고 싶다고 하자 손사래를 치신다.
“찍지 마, 내 얼굴이 시커먼 기 매린 없어.”
“아이고, 이뿌기만 하시구만요. 자아, 할머니 여기 핸드폰을 잠깐만 보세요.”
다정하게 사진 찍는 걸 본 ‘영감’이 멀리 있다가 갑자기 다가와서 휙 지나가며 “사진을 뭘 찍고 그래?” 하고 퉁명스럽게 뱉고는 빗자루를 들고 나가신다.
“할머니이~ 여기 잠깐만 보세요.”
“어허, 찍지 말라니까 그러네, 어델 보라고?”
“여기, 여기요.”
“찍지 마, 어델 보라고? 아, 이걸 머세 쓸라고 찍으까? 오리밥이나 한 봉지 사든지.”
“네, 할머니 강냉이 한 봉 주세요. 사진 고마워요.”
할머니가 말하는 사이 얼른 사진을 찍고, 오리밥 강냉이를 한 봉지 사서 든다.
가게를 나왔더니 ‘영감’은 똥을 치우고 계셨고, 오리들은 다 없어졌다.
오리밥을 든 나는 궁둥이를 씰룩거리며 오리를 찾아 강으로 뒤뚱뒤뚱 걷는다.
발걸음마다 오리 똥이 놓여 있다.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시더라도 똥은 싸 놓지 마시지, 중얼거리며 야생을 찾아간다.
종을 넘어선 할머니의 인정이 귀하다는 생각을 하는 초여름이다.
2021-06-09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