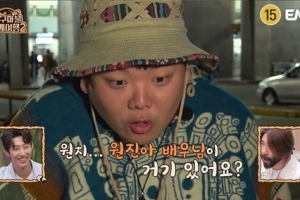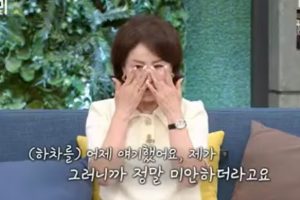광복 70주년을 맞아 끝나지 않은 친일 청산 논란이 이슈의 중심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 우리 사회가 과거에 대한 규명과 성찰을 넘어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와 같이 과거의 멍에를 짊어졌던 해외 과거사 청산과 반민족 범죄 처벌 사례를 통해 반면교사를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나치정권 패망 후 탈나치화 작업을 통해 나치 관련 경력자를 대거 처벌한 독일이나, 나치 점령기 동안의 대독 부역자를 대량으로 숙청한 프랑스는 종종 철저한 과거사 청산 사례로 꼽힌다. 독일은 1946년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에서 ‘반인륜범죄’를 최초 규정해 10만명 이상을 구금하고 10만명 가까이를 공직과 기업에서 해직했다. 프랑스도 2차 세계대전 종료 후 대독 부역자 10만여명을 사형·징역에 처하고 공민권을 박탈했다. 스페인도 1930년대 내전과 70년대까지 이어진 프랑코 독재정권에 추종한 자들에게 프랑코 사후 처벌이 내려졌다.
하지만 과거사 청산에서 중요한 것은 인적 청산 자체만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만큼 역사에 대한 교훈과 반성으로 이어지는가 하는 점이다. 이런 관점에서 독일과 프랑스, 스페인도 한계를 드러낸 것이란 지적이 따른다.
독일에서는 패전국의 행위만 문제 삼는 ‘승자의 재판’이란 문제점을 노출했고 유대인 대량학살 규명에도 소홀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대독 부역자에게 불관용 원칙을 적용한 프랑스도 정작 자신들의 식민지인 알제리에서(독립운동 1954~62년) 수많은 사람들을 고문·학살하고 이를 정당화했다.
반면 남아프리카공화국은 1960~90년대 이어진 인종차별에 대해 1995년 ‘진실화해위원회’를 만들어 진상 규명과 국민화합을 동시에 달성하려 노력했다.
도시환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은 “과거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선 가해자들의 깊은 반성과 사죄가 필요하다”면서 “그런 과정을 거쳐야 우리 사회가 화해와 성찰을 통한 미래지향적 사회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나치정권 패망 후 탈나치화 작업을 통해 나치 관련 경력자를 대거 처벌한 독일이나, 나치 점령기 동안의 대독 부역자를 대량으로 숙청한 프랑스는 종종 철저한 과거사 청산 사례로 꼽힌다. 독일은 1946년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에서 ‘반인륜범죄’를 최초 규정해 10만명 이상을 구금하고 10만명 가까이를 공직과 기업에서 해직했다. 프랑스도 2차 세계대전 종료 후 대독 부역자 10만여명을 사형·징역에 처하고 공민권을 박탈했다. 스페인도 1930년대 내전과 70년대까지 이어진 프랑코 독재정권에 추종한 자들에게 프랑코 사후 처벌이 내려졌다.
하지만 과거사 청산에서 중요한 것은 인적 청산 자체만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만큼 역사에 대한 교훈과 반성으로 이어지는가 하는 점이다. 이런 관점에서 독일과 프랑스, 스페인도 한계를 드러낸 것이란 지적이 따른다.
독일에서는 패전국의 행위만 문제 삼는 ‘승자의 재판’이란 문제점을 노출했고 유대인 대량학살 규명에도 소홀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대독 부역자에게 불관용 원칙을 적용한 프랑스도 정작 자신들의 식민지인 알제리에서(독립운동 1954~62년) 수많은 사람들을 고문·학살하고 이를 정당화했다.
반면 남아프리카공화국은 1960~90년대 이어진 인종차별에 대해 1995년 ‘진실화해위원회’를 만들어 진상 규명과 국민화합을 동시에 달성하려 노력했다.
도시환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은 “과거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선 가해자들의 깊은 반성과 사죄가 필요하다”면서 “그런 과정을 거쳐야 우리 사회가 화해와 성찰을 통한 미래지향적 사회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5-01-02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