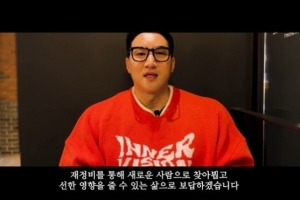세월 흐름까지 잡아내는 신구·손숙의 섬세한 연기
다음 달 12일까지 서울 명동예술극장에 오르는 연극 ‘드라이빙 미스 데이지’(윤호진 연출)는 괴팍한 노친네 데이지와 흑인 운전기사 호크의 우정을 그려내고 있다. 알프레드 유리의 원작소설은 퓰리처 상을 탔고, 영화는 아카데미와 베를린영화제에서 상을 받았으니 우리 시대 고전이라 할 만하다. 한국에서는 처음 무대에 올랐다.

차별은 언제나 중층적이다. 차별적 사회에서 내가 차별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남을 차별해야 한다. “난 저들 편이 아니에요, 난 당신들 편에 속해 있어요.”라는 신호를 끊임없이 보내야 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듯, 이게 파시즘의 심리학이다. 처음부터 호크에게 냉담하기 이를 데 없을 뿐 아니라 흑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도둑으로 몰거나 바보 같은 어린애로 취급해 버리고야 마는 데이지 여사의 심리란, 주류 백인 사회에 편입하지도 못하면서 비주류계층에 ‘난 너희들과 달라.’라고 말하고 싶은 심리와 비슷하다. 극은 호크의 인간적이고 성실한 모습에 데이지 여사가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는 과정을 비춘다.
점차 처져가는 고개와 허리 각도, 조심조심 내딛는 발걸음, 약간씩 흔들리는 손, 가늘어져 가는 목소리와 힘이 빠져가는 안광 같은 것으로 20여년에 걸친 세월의 흐름을 섬세하게 잡아내는 신구(오른쪽)와 손숙(왼쪽)의 연기력은 높이 살 만하다.
특히 호크 역을 위해 수염을 직접 기르고 ‘검정칠’까지 마다하지 않은 신구는 데이지 여사 아들과 연봉 협상하는 장면, 1주일 만에 데이지 여사를 차에 태우는 데 성공한 뒤 “하나님도 세상을 만드는데 1주일은 걸렸다.”고 너스레를 떠는 장면 등에서는 무척 귀엽다.
잔잔하고도 훈훈한 힘이 넘치는 작품이다. 다만, 영화와 별 차이가 없는 내용 때문에 에피소드 나열 식으로 진행돼 영화 편집본 같은 느낌이 강하다. 미국에선 연극이 먼저였으나 한국에서는 영화가 먼저였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10-08-30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