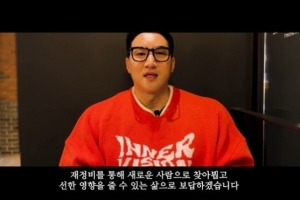사라져 가는 풍경들…
아틀란티스/윤성택바다 속 석조기둥에 달라붙은 해초처럼
기억은 아득하게 가라앉아 흔들린다
미끄러운 물속의 꿈을 꾸는 동안 나는 두려움을 데리고
순순히 나를 통과한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곳에 이르러
막막한 주위를 둘러본다 그곳에는 거대한 유적이 있다
폐허가 남긴 앙상한 미련을 더듬으면
쉽게 부서지는 형상들
점점이 사방에 흩어진다 허우적거리며
아까시나무 가지가 필사적으로 자라 오른다
일생을 허공의 깊이에 두고 연신 손을 뻗는다
짙푸른 기억 아래의 기억을 숨겨와
두근거리는 새벽, 뒤척인다 자꾸 누가 나를 부른다
땅에서 가장 멀리 길어올린 꽃을 달고서
뿌리는 숨이 차는지 후욱 향기를 내뱉는다
바람이 데시벨을 높이고 덤불로 끌려다닌 길도 멈춘
땅속 어딘가, 뼈마디가 쑥쑥 올라왔다 오늘은
차갑게 수장된 연대가 그리운 날이다
나는 별자리처럼 관절을 꺾고 웅크린다
먼데서 사라진 빛들이 떠오르고 있었다


시간은 느리고도 길게 이어지는 삶에서 퇴색의 속성으로 사라져 간다. 그리고 가끔은 그 자리에서 멈춰 이편을 바라본다. 도시는 이러한 시간에 대한 경배 없이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재개발’이라는 제호 아래 옛 풍경들이 거대한 아파트 그늘에 묻히곤 한다. 깊이 모를 심연처럼 창백하고 적막한 그곳에서 희망은 차고 기억은 시리다. 빈집을 바라보면 볼수록 그 집이 과거를 버티기 위해 얼마나 많은 황폐한 날들을 견뎠는지 짐작케 한다. 현실이 추억을 왜곡하듯 어쩌면 이곳은 또 다른 의미로 집들의 어두운 비유일지 모른다. 재개발지역 언덕에서 집들은 낮게 어깨를 맞대며 그렇게 골목을 품고 있다.


울타리 하나 사이로 나뉘는 재개발 풍경
벚꽃 잎들이 공중에 흩날린다. 고요하고 고단한 바람, 점점이 날리는 흰 빛은 언제나 무심하다. 오랜 오후를 견뎌온 담벼락들은 골목에 기대어 조락한 햇볕을 받는다. 벚꽃이 흐드러질수록 나무는 저 혼자 햇빛을 흔들고 어느 처마 밑 거미줄은 기면(嗜眠)에서 운다. 전선들은 기와 틈 사이의 무늬를 엮어 곁가지처럼 뻗어간다. 전깃줄이 집과 집을 얽혀 세우는 동안 어느새 저녁이 걸리고, 비로소 불빛이 발갛게 열린다. 그러니 이 골목에 들어서면 집들의 마음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 대문과 대문을 음미하면서 찬찬히 걸어가 대화하듯 에돌아 나오는 길.


나무는 저 혼자 햇빛을 흔들고 있다
색색의 페인트칠도 오래 혼자가 되면 세월을 탄다. 얼룩이 지고 균열이 생기며 그 틈으로 역마살이 낀 이끼가 오른다. 흐린 날 부식된 하늘처럼 현기증 나는 구름이 머물다 간다. 점점 회색빛 색조로 닮아가는 이 언덕을 훗날 무어라 불러야 할까. 하나의 시간으로 연대해 빛을 받아 빛나기도 하고 그 빛을 거둬들이는 언덕 위의 집들. 시멘트 내부의 앙상한 골격으로 서로 기대어 올 때 그게 누구의 집이라도 버텨주고 싶은 담들의 결림. 콘크리트를 콘트라베이스라 고쳐 발음하다 보면, 그 저음에 닿는 바람이 빨랫줄을 느리게 그어 보는 활이다.


스스로 만든 여정이 이곳이라는 듯 두 노인은 태연하다
들뜬 시멘트는 늘 그 색깔에서 집착을 놓아준다. 더 이상 붙잡을 수 없을 때 집들은 기억을 습기로 어루만지며 서로의 벽이 된다. 서로 다른 벽이 만나서 같은 색으로 퇴색해 가는 골목길. 이 길에서는 함부로 담겨진 흙도 싹을 틔운다. 그리고 살아간다. 아무도 없는 적막이 그 계단의 양분이다. 안녕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이별을 받아들일 것 같은 벽 앞에서, 얼룩의 느낌보다 얼룩을 벗고 있는 벽의 느낌으로 눈을 감는다. 그리고 한때 벽이었던 수많은 망설임들을 기억한다.


어떤 연민이 서린 것 같은 강아지


넝쿨이 집의 내력에 깃들어 있다
글·사진_ 윤성택 시인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