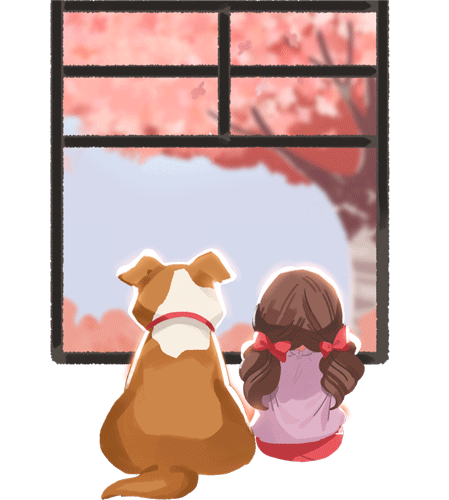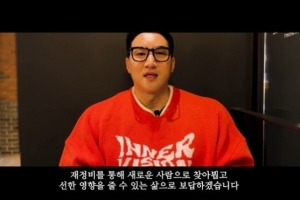ⓒ신웅재-The biggest tin mine in Pemali, Bangka Island, Indonesia. May 8, 2016
그러나 스트레이트로 찍은 이 사진의 뒤에는 말하자면 ‘반도체가 숨어 있다’.
협곡은 인공을 가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이르는 원생이 아니다. 협곡이 펼쳐진 자리는 본디 길과 나란한 높이의 평지였다. 그 평지를 사람들이 주석을 캐기 위해 오랜 세월 파고 또 파서 저와 같은 협곡이 생긴 것이다. 인도네시아 방카섬에 인공적으로 생겨난 이 협곡의 깊이와 너비는 사람들이 파헤친 욕망의 크기다.
사진 안에서 한 사람은 선 채로, 한 사람은 앉은 채로인 인물들은 사금을 캐듯이 주석을 캐고 있는 중이다. 생계가 어려운 섬 주민들은 주석 광산으로 쓰임을 다한 이곳에서 아직도 불법 채굴을 이어 가고 있다. 파괴된 환경 생태계와 섬 주민들의 무너진 경제 생태계를 한 장의 사진 안에 압축한 것이다.


박미경 갤러리 류가헌 관장
방카섬은 섬 전체가 주석이 풍부해 수백 년간 전 세계 주석의 공급원이었던 섬이다. 반도체칩을 이용하는 제품 제작에 주석이 필수 광물로 사용되면서 현재는 토양 파괴를 넘어 인근 해역의 생태계까지 재앙에 가까운 환경문제에 직면해 있다. 방카섬에 관한 르포르타주가 ‘모래’의 일부라면 아프리카 각지와 유럽 국가의 산업폐기물을 처리하는 가나의 수도 아크라 슬럼 지대 사람들의 전자제품 소각 현장은 ‘재’에 해당한다. 서울과 뉴욕, 도쿄에서 새로운 휴대전화의 출시에 열광하는 인파에서부터 전자제품에 둘러싸인 일상까지 반도체가 최첨단 기기로 소비되는 대도시의 모습들도 포착했다.
반도체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공장 노동자들의 안전을 방치하고 그들이 처한 위험과 죽음을 은폐해 온 반도체 메모리칩 전 세계 시장점유율 1위의 ‘자랑스러운 한국 기업’을 상대로 피해 노동자들과 가족들이 벌여 온 11년간의 투쟁 또한 기록했다. 반도체칩이 생산되고 소비되고 폐기되는 전 과정에 걸쳐 일반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명백히 존재하고 발생하는 ‘감춰진’ 폐해들을 사진의 힘으로 ‘보여 주는’ 것이다.
다큐멘터리 사진은 처음 그 용어가 시작된 20세기 초부터 지금껏 망각의 반대편에서 ‘우리 주위의 세상을 묘사하려는 정직한 노력’(‘세계, 인간, 그리고 다큐멘터리’에서 스튜어트 프랭클린이 말한 다큐멘터리의 정의)을 지속하고 있다. 세계 여러 지역을 하나의 ‘현장’으로 넘나드는 젊은 사진가 신웅재는 그 다큐멘터리 사진의 가치에 복무 중이다.
2019-05-14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