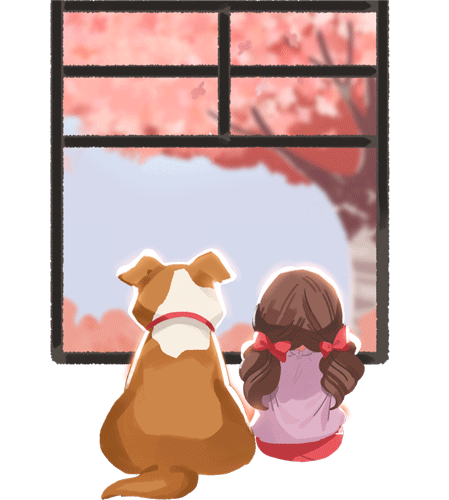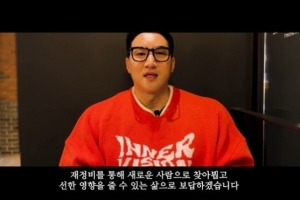“아직 퇴근 안 하셨네요?” 종종 취기를 보이던 그이여서 술을 드셨나 했는데 말짱한 눈빛이었다. “응. 언니, 이것 좀 먹어 봐.” 그이는 대답과 동시에 신문지에 싼 뭔가를 꺼내 주섬주섬 펼쳤다. “아, 아니에요.” “쑥버무리야. 맛있어. 동네 언니가 나 먹으라고 해준 거야.” “아니에요. 괜찮아요.” 사양해도 아랑곳없이 그이는 쑥버무리를 한 조각 떼어 입에 넣어 주려 했다. “아, 지금은 못 먹어요. 그럼 나중에 먹을게요.” 그이는 좀 아쉬운 얼굴로 크게 한 덩이 떼어 내밀었다. 그리고 발치의 보따리에서 오이 한 개를 꺼내 주면서 목마를 텐데 베어 먹으라고 했다.


황인숙 시인
5월이 되자 그이의 길거리 꽃가게가 사뭇 화사하게 눈을 끌었다. 어버이날과 스승의날을 겨냥한 꽃바구니들이 등장한 것이다. 해마다 그이의 꽃바구니 만드는 솜씨가 늘었는데, 올해는 색깔도 조화롭고 세련된 게 나도 하나쯤 가져다 식탁에 놓고 싶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그맘때 길거리에서 흔히 보는 그저 그런 꽃다발과 꽃바구니였는데 말이다. 그 성의 없이 천편일률적으로 만든 카네이션 묶음을 떠올리면, 왜 어버이를 비롯한 어르신들이 5월에 가장 받기 싫은 선물로 꽃을 꼽는다는 건지 이해가 된다.
그이의 꽃꽂이 솜씨가 일취월장했다는 건 나만의 생각이 아니다. 이웃 동네에 사는 후배가 오가다 보았다며 말했다. “그 할머니, 꽃바구니 정말 예쁘게 만들던데요.” “어, 할머니? 그 사람 할머니 아닌데…. 내 또래야. 그 사람은 동안인데.” “어…, 멀리서 봐서 그런가? 할머니던데. 선생님한테는 할머니라는 느낌 한 번도 안 받았는데.” 쩝, 이러나저러나. 돈벌이가 될 듯해서 5월에 꽃을 엮어 팔기 시작했던 그이의 소양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다. 그래서인지 이번에는 꽃바구니가 잘 팔리는 게 눈에 띄었다. 어쩌면 그이가 겨울에는 졸업식이나 입학식에 어느 학교 앞에서인가 꽃을 팔았을지 모르겠다. 아니었다면 앞으로 그러시라고 권해 봐야지. 화초에 둘러싸여 있고 꽃을 만지는 게 그이의 행복인 듯하다.
‘내가 방귀를 뀔 때/ 내 고양이는/ 관심도 없지.’ 찰스 부코스키의 시 ‘분별 있는 친구’ 전문이다. 그이에게 화초는 분별 있는 친구일 테다. 나는 물론 꽃을 싫어하지 않지만, 잘 알지 못한다. 이제하 선생님을 뵈러 제주도에 갔다가 만춘서점에서 ‘나무수업’을 샀다. 굉장히 잘 고른 책이다. 알지 못하고 무관심했던 나무의 사생활과 사회생활에 대해서 흥미진진하게 배웠다. ‘목걸이의 강도는 제일 약한 고리의 튼튼함에 달려 있다.’ 유럽의 옛 수공업자 사이에 떠돌던 말이란다. 겉보기에 살아남지 못할 것 같은 나무가 숲에서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과 숲 전체 건강에 대한 비유다.
2019-05-21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